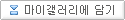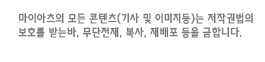'생태학적 예술'의 뜻으로 1970년대 대지예술의 후속으로 미국에서 전개된 미술경향
자연의 순환과정 미 물리적, 화학적 변경 등에 관심을 기울여 그것을 설치나 퍼포먼스 형식으로 보여준 예술로 주로 다큐멘테이션 형식으로 보존되고 있다. 이 용어는 대략 1968년 이후부터 사용되었다. 자연은 사실 미술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미술작품에 가장 많이 반영된 소재이며 그것의 원시적 사명감에 대한 미술가들의 향수와 애착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자연에 대한 간접적인 사실적, 추상적 해석에서부터 그 속으로 직접 들어가 함께 호흡하며 시도한 현상적 측면의 경이성에 대한 예술적 재구성 등 여러 형태로 미술에 응용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자연현상의 역사적 재구성이나 변형 과정의 추적을 통해 자연의 시적 특징에 관한 단순한 예술적 탐구를 넘어서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하나의 사회적 이슈로 부각 시킨 것에 그 특색이 있다.
대표적 작가로 앨런 손피스트가 있다. 손피스트는 1977년 뉴욕의 라 구아르디아 광장의 한 쪽에 <시간의 풍경>이라는 대지 예술적 성격의 혼경 조소를 제작하였다. 이 작품은 일반적인 조소와는 달리 몇 세기전의 뉴욕 맨하튼 같은 섬에서나 볼 수 있었던 희귀한 관목들로 구성되었다. 땅에 직접 나무를 심은 점에서 대지 예술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며 도시가 생성되기 이전의 생생함을 보여주기 위해 각 분야의 학자들의 도움을 얻어 변천과정르 추적해 옛 모습을 복원시켰다. 이는 인공적인 쓰레기더미로 황폐해 가는 현대의 병든 자연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보여주는의미 있는 은유'로 평했다. 그 밖에 기후 조건과 풍토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재구성한 앤디 골드워시, 원래 청치예술로 시작했으나 사회적 관심의 범주를 넓혀 물, 물고기, 풀 등의 소재로 환경오염에 관한 설치 작품을 제작한 한스하케, 미술을 사회 개선책의 한 방편으로 보고 첨단 사회의 부산물인 환경오염물질이 자연에 끼친 해약을 과학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글, 그림, 모형 등을 통해 보여준 헬렌&뉴턴 해리슨 등도 이 경향에 넣을 수 있다.

Traditional design, eggshells, unknown artist, 16th Festival